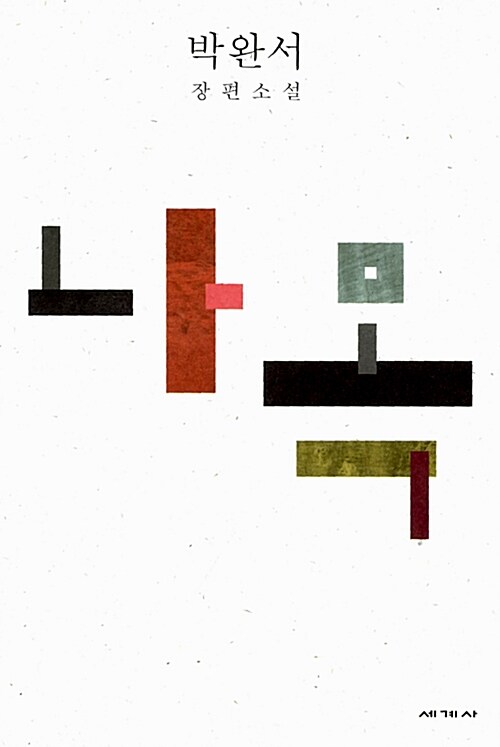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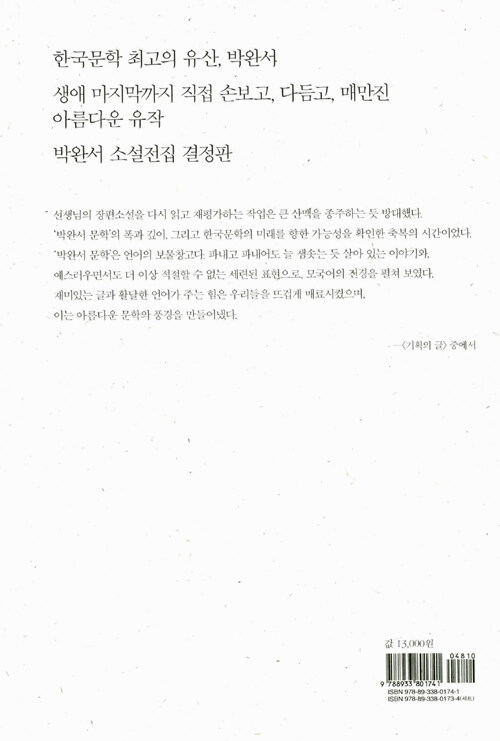

나는 모두, 옥희도 씨를 포함한 모두가 어떻게 살까를 알고 있다는 게 자꾸만 부럽고 불안했지만 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막연하고도 좀 건방지게 들리는 물음 자체가 대단한 철학 용어처럼 난해했다. 186
문득 여벌로 또 하나의 태수가 있었으면 했다. 내가 마음 편하게 무관심할 수 있는 태수와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애착하고 접촉할 수 있는 태수가 따로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한 사람에게 내 멋대로 애착과 무관심을 변덕스럽게 반복한다는 것은 암만해도 좀 잔인했다. 192
“난 이 황량한 도시 어디에나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 잔디가 돋으면 너와 그 궁전의 뜰을 거닐 것을 공상했다. 잔디를 뒹굴며 너를 애무하길 바랐어. 너 그럴 용기가 있니? 있으면 너는 분명히 찰불걸.”
언젠가 미숙이가 미군과 정식 결혼을 해도 양갈보라고 할까 하며 근심하던 생각이 났다. 그 어린것도 결혼에 따른 두려움이나 동경보다는 남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은 얼마나 남의 시선에 예민한 족속일까. 양갈보, 실상 나라고 뭇사람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초연할 배짱이 있을까. 237
“오, 어떡하면 자네가 알아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미칠 듯이 암담한 몇 년을, 그 회색빛 절망을, 그 숱한 굴욕을, 가정적으로가 아닌 예술가로서 말일세. 나는 곧 질식할 것 같았네. 이 절망적인 회색빛 생활에서 문득 경아라는 풍성한 색채의 신기루에 황홀하게 정신을 팔았대서 나는 과연 파렴치한 치한일까? 이 신기루에 바친 소년 같은 동경이 그렇게도 부도덕한 것일까?” 350
'밑줄여행 > 인문, 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히피 - 파울로 코엘료 문학동네 e-book (0) | 2022.02.21 |
|---|---|
| 폭력과 정의 - 안경환 김성곤 김영사 2019 04810 (0) | 2022.01.17 |
| 존엄하게 산다는 것 - 게랄트 휘터 e-book (0) | 2021.12.06 |
|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 아고타 크리스토프 e-book (1) | 2021.11.08 |
| 마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생텍쥐페리의 아포리즘) E-book - 정여울 홍익출판사 2015 03810 (0) | 2019.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