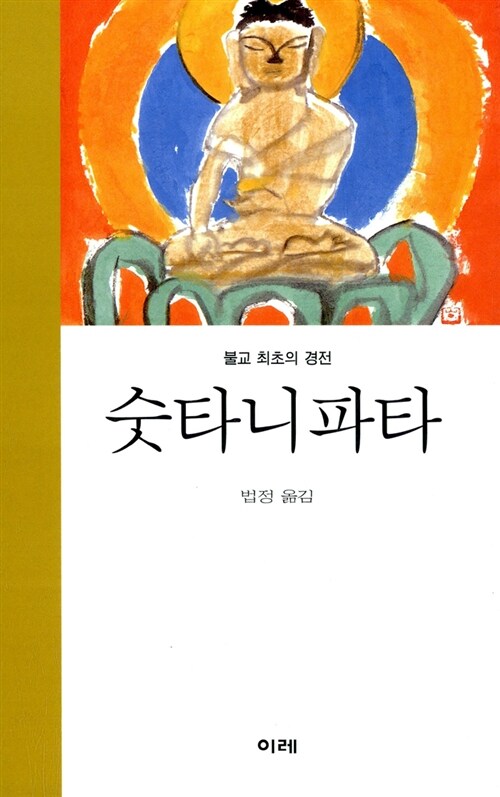머리말
어른은 별다른 노력이 없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나이를 먹으니 어른이 되어 버렸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어른으로 대접하고 있으니까요. 5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없다면, 어른이라고 해도 어른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야 어른입니다.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힘과 자유는 나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갖고 싸워 얻어야 하는 것임을. 6
프롤로그 - 잠옷을 입고 실내에 있을 수도 없고 실외로 나갈 수도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도대체 내가 했던 모든 행동 중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은 있기라도 한 것일까?’ ...
나와 같은 사람은 1,000년 전에도 없었고 1,000년 뒤에도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행동은 너무나 타인들과 유사합니다. 그것도 지독하게 유사합니다. 이건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를 흉내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베케트(Samuel Baclay Beckett, 1906-1989)라는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작가가 고민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13
‘화두(話頭)’.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길이 없는 딜레마나 역설로 가득 차 있는 물음이 바로 화두입니다. ...
화두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 내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 같은 겁니다. 상식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풀릴 수 없는 역설로 보이지만,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이 화두이기 때문이지요. 15
스님들이 싯다르타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멋지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16
‘무문관’ .. ‘문이 없는 관문’. 18
타인이 만든 문을 찾으려 두리번거리지 말고 온몸을 던져 뚫어 내라는 겁니다. 20
어느 날 사찰 깃발이 바람에 나무끼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두 스님이 서로 논쟁을 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주장만이 오갈 뿐, 논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때 육조 혜능은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두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무문관> 29칙 비풍비번(非風非幡). 24
깨달음을 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과 그것을 몸소 체현하고 산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32
서암 사언 화상은 매일 자기 자신을 “주인공!”하고 부르고서는 다시 스스로 “예!”하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깨어 있어야 한다! 예!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예! 예!”라고 말했다. <무문관> 12칙 암환주인(巖喚主人). 33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36
<논리철학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을 빌린다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 버려야”하는 법입니다. 37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달리 말해 내 자신이 가진 잠재성을 활짝 꽃피우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7
송원 화상이 말했다. “힘이 센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가?” 또 말했다. “말을 하는 것은 혀끝에 있지 않다.” 20칙 대역량인(大力量人) 42
‘여여(如如)’ 혹은 ‘타타타’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지요. ...
불변하는 영원한 자아를 불교에서는 ‘아(俄, atman)’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이런 영원한 자아를 부정합니다.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 마음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44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수행은 우리의 생생한 경험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희론(戱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희롱하는 논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논의라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말해 희론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도록 만드는 색안경과 같은 것이지요. 45
?비트겐슈타인의 충고를 반복하고 싶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보라(Don't think, but look)!"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럴 거야'라는 가치평가나 희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근본적인 경험을 있는 그래도 여여하게 직시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50
파토 화상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무문관> 44칙, '파초주장(芭蕉?杖)' 51
주장자(柱杖子)를 아시나요. 큰스님들이 길을 걸을 때나 설법을 할 때 들고 계시는 큰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장자는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 즉 '불성(佛性)', 혹은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실현한 사람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51
'주장자가 없다'는 생각, 그리고 부처라는 생각마저 내려놓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파초 스님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53
베그르송(Henri Bergson, 1859~1941)은 자신의 주저 <창조적 진화>에서 "'없다'고 생각된 대상의 관념 속에는, 같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의 관념보다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없다'는 생각이 '있다'는 생각보다 무엇인가 하나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54
'지갑이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애인과 헤어졌어' 등등. 우리는 매번 '없음'에 직면하며 당혹감과 비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지갑이 주머니에 있었다는 기억을, 살아 계신 어머니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집착의 기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의 부재가 주는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고통일 겁니다. 없다는 느낌은 그만큼 그것이 있었을 때 느꼈던 행복을 안타깝게도 더 부각시키는 법이니까요. 55, 58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 부처를 꿈꾸는 마음이 강해지면, 이제 역으로 자신이 아직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런 절망이 다시 부처에 더 집착하도록 만들게 될 겁니다. .. 집착은 깨달은 자가 가지는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니까요. .. 주장자가 있다는 오만도, 그리고 주장자가 없다는 절망도 모두 집착일 뿐입니다. 59
구지 화상은 무엇인가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단지 손가락 하나를 세울 뿐이었다. 뒤에 동자 한 명이 절에 남아 있게 되었다. 외부 손님이 "화상께서는 어떤 불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나요?"라고 묻자, 동자도 구지 화상을 본더 손가락을 세웠다. 구지 화상이 이런 사실을 듣고, 동자를 불러 칼로 그의 손가락을 세웠다. 구지 화상이 이런 사실을 듣고, 동자를 불러 칼로 그의 손가락을 잘랐다. 동자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방 밖으로 나가오 ㅆ는데, 구지 화상은 동자를 다시 불렀다. 동자가 고개를 돌리자, 바로 그 순간 구지 화상은 손가락을 세웠다. 동자는 갑자기 깨달았다.
구지 화상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천룡 스님에게서 '한 손가락 선'을 얻어 평생 동안 다함이 없이 사용했구나!" 말을 마치자 그는 입적했다. <무문관> 3칙. '구지수지(俱?竪指)' 60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자신의 본래면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61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에서 반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나는 '동일자의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차이의 반복'입니다. 63
<장자(莊子)>라는 책에는 '한단지보(邯鄲之步)'라는 고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초(楚)나라 사람이 세련되어 보이는 조(趙)나라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다가 조나라 스타일의 걸음걸이도 익히지 못하고 예전 초나라 스타일의 걸음걸이마저 까먹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 다른 걸음걸이를 흉내 내는 것이 '동일자의 반복'이라면, 자기만의 걸음걸이를 걷는 것이 바로 '차이의 반복'에 해당. 그러니까 남을 흉내 내지 않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기만의 차이를 실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항상 남을 흉애 내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65
남전 화상은 동당과 서당의 수행승들이 고양이를 두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고양이를 잡아 들고 말했다. "그대들이여, 무엇인가 한다미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고양이를 살려 줄 테지만, 말할 수 없다면 베어 버릴 것이다." 수행승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전은 마침내 그 고양이를 베어 버렸다. 그날 밤 조주가 외출하고 돌아왔다. 남전은 낮에 있던 일을 조주에게 이야기했다. 바로 조주는 신발을 벗어 머리에 얹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러자 남전은 말했다. "만일 조주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양이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문관> 14칙. '남전참묘(南泉斬猫)' 68
신발을 머리에 얹었다는 것은 조주가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자는 머리에 얹고 신발을 발에 신는 것을 영원불변한 진리이자 규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신발을 머리에 얹거나 모자를 발에 신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인공이 아니라 습득한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 아닐까요. 반면 신발을 머리에 얹음으로써 조주는 신발과 모자와 관련된 기존의 통념, 혹은 기존의 생활양식을 경쾌하게 부정해 버립니다. 71-73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bestimmende Urteilskraft)'과 '반선적 판단력(reflektierende Urteilskraft)'으로 구분합니다. 모자는 머리에 쓰고 신발은 발에 신어야 한다는 기존의 규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규정적 판단력이라면, 기존의 규칙을 부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판단이 바로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력이 규칙을 따르는 생각이라면, 반성적 판단력은 규칙을 창조하는 생각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73
어느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운문 스님은 "마른 또 막대기"라고 말했다. <무문관> 21칙, '운문시궐(雲門屎?)' 104
부처에게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불할 수 없습니다. 부처란 당당한 주인공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니까요. 107
깨달음은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아는 것이고, 해탈은 조연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109
동산 스님이 설법하려고 할 때, 운문 스님이 물었다. "최근에 어느 곳을 떠나 왔는가?" 동산은 "사도(査渡)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운문 스님이 "여름에는 어디서 있었는가?"라고 묻자, 동산은 "호남의 보자사(報慈寺)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바로 운문 스님이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라고 묻자, 동산은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은 말했다. "세 차례 후려쳐야겠지만 너는 용서하마."
동산은 다음 날 다시 운문 스님의 처소로 올라와 물었다. "어저께 스님께서는 세 차례의 몽둥이질을 용서하셨지만, 저는 제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말했다. "이 밥통아! 강서로 그리고 호남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것이냐!" 이 대목에서 동산은 크게 깨달았다. <무문관> 15칙. '동산삼돈(洞山三頓)' 120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제자가 스스로 깨달음의 등불을 발화시키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뿐입니다. 121
<임제록>에서 임제의 속내를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은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는 그의 사자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는 뜻입니다. .. "안이건 밖이건 만나는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죽여 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탈한다는 것,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일체의 외적인 권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당당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22-123
여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여행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무슨 말인지 금방 짐작하실 겁니다. 가짜 여행은 출발지도 있고 목적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 도중에서도 항상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느라 여행 자체를 즐길 수가 없을 겁니다.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고, 그리고 서둘러 출발지로 되돌아와야만 하니까요. 당연히 여행 도중에서 만나게 되는 코를 유혹하는 수많은 꽃 내음들, 뺨을 애무하는 바람들, 실개천의 속삭임들, 지나가는 마을에서 열리는 로맨틱한 축제조차도 그는 향유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니, 그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사건과 사물들을 저주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목적지에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에게 여행의 주인공은 그 자신이라기보다는 출발지와 도착지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장자(莊子, BC369~BC289?)는 진짜 여행을 '소요유(逍遙遊)'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逍遙)'라는 말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한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도 진짜 여행이란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는 여행이라는 것을 알았던 셈입니다. 진짜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여행 도중에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멋진 곳이면 며칠이고 머물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면 과감하게 떠납니다. 간혹 아름다운 새를 쫓다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일쑤입니다. 그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노예가 아니라, 맵ㄴ 출발지와 목적지를 만드는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알튀세르(ALouis Althusser, 1918~1990)눈 <유물론 철학자의 초상>이라는 글에서 이런 사람을 '유물론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주 늙었을 수도 있고, 아주 젊었을 수도 있다. 핵심적인 것은 그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나 그는 미국 서부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달리는 기차를 탄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기원), 어디로 가는지(목적) 전혀 모르면서."
인간의 삶을 여행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삶 자체가 바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제대로 영위하려면 우리는 기원과 목적, 과거와 미래,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니,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자연스럽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제 스님의 말처럼 모든 것이 참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만나는 것마다 따뜻한 시선으로 모두 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목적지로 가느라, 혹은 출발지로 되돌아오느라 분주한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자비로운 마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문관>의 열다섯번째 관문을 통화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임제의 가르침을 한 글자 한 글자 깊게 아로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수(隨)' '곳 처(處)', '될 작(作)', '주인 주(主)', '설 입(立)', '곳 처(處)', '모두 개(皆), '참될 진(眞)'. 수처작주, 입처개진! 125-127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의 집회에서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때 대중들은 모두 침묵했지만, 오직 위대한 가섭만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말했다. "내게는 올바른 법을 보는 안목, 즉 열반에 이른 미묘한 마음, 실상(實相)에는 상(相)이 없다는 미묘한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어 가르침 이외에 별도로 전할 수밖에 없기에 위대한 가섭에게 맡기겠다." <무문관> 6칙, '세존염화(世尊拈花)' 130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만의 세계가 있고, 깨달은 사람에게도 그만의 세계가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고 다른 진짜 세계, 혹은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136-137
어느 스님이 물었다. "광명이 조용히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치니..." 한 구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운문 스님은 갑자기 말했다. "이것은 장졸 수재의 말 아닌가!" 그 스님은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은 "말에 떨어졌군"이라고 말했다.
뒤에 사심 스님은 말했다. "자, 말해 보라! 어디가 그 스님이 말에 떨어진 곳인가?" <무문관> 39칙, '운문화타(雲門話墮)' 138
제도나 관습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인공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노예의 삶일 뿐이기에, 스님이 되어야만 부처가 된다는것은 불교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139
-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깨달음에 대해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
현대 영국의 철학자 라일(Gilbert Ryle, 1900~1976)도 자신의 논문 <실천적 앎과 이론적 앎>에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 상황에 대한 지적인 명제들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요리하거나 운전할 줄 모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실천적 앎과 단지 이론적으로만 아는 이론적 앎을 명확히 구분한 이야기입니다. 143-144
말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로 깨달았는지의 여부니까요.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의 횡설수설이 모두 오도송입니다. 반대로 깨닫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그가 경전이나 선사의 말에 부합되는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모두 횡설수설에 불과한 법입니다. 145
깨달은 스승이 깨닫지 않은 제자를 강제로 깨달음에 이끌 수는 없습니다. 제자 스스로 깨닫도록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148
백장 화상이 설법하려고 할 때, 항상 대중들과 함게 설법을 듣고 있던 노인이 한 명 있었다. 설법이 끝나서 대중들이 모두 물러가면, 노인도 물러가곤 했다.그런데 어느 날 노인은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백장 화상이 물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섭 부처가 계실 때 저는 이 산에 주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학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因果)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가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화상께서 제 대신 깨달음의 한마디 말을 하셔서 여우 몸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마침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살마도 인과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라고 묻자, 백장 화상은 대답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백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크게 깨달으며 절을 올리면서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어서 그것을 산 뒤에 두었습니다. 화상께서 죽은 스님의 예로 저를 장사 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장 화상은 유나에게 나무판을 두들겨 다른 스님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양을 마친 후 죽은 승려의 장례가 있다." 그러자 스님들은 서로 마주보며 쑥덕였다. "스님들이 모두 편안하고 열반당에도 병든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분부를 내리시는 것인지?" 공양을 마친 후 백장 화상은 스님들을 읶르로 산 뒤쪽 큰 바위 밑에 이르러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 마리를 끌어내어 화장(火葬)을 시행했다.
백장 화상은 저녁이 되어 법당에 올라가 앞서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황벽 스님이 바로 물었다. "고인이 깨달음의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500번이나 여우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매번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백장 화상은 말했다. "가까이 앞으로 와라. 네게 알려 주겠다."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황벽 스님은 스승 백장의 뺨을 후려갈겼다. 백장 화상은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달마의 수염이 붉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붉은 수염의 달마가 있었구나!" <무문관> 2칙, '백장야호(百丈野狐)' 154-155
죽어서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인간이 살아 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정신입니다. 155
나가르주나(Nagarjuna, 150?~250?). .. 불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이론가입니다. 나가르주나는 흔히 제2의 싯다르타이자 동시에 대승불교 여덟 종파의 시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그의 주저 <중론(中論)>에 보면 "어떤 존재도 인연(因緣)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空)하지 않은 것이 없다." 156
그저 인연이 맞아서, 혹은 인연이 서로 마주쳐서 무엇인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인연이 다해서, 혹은 인연이 서로 헤어져서 무엇인가가 소멸할 뿐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생겼다고 기뻐하거나 무엇이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해도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라는 개념으로 나가르주나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공하다고 보기에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157-158
핵심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로 표현되는 불교의 강력한 현실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대부분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나가르주나에 따르면 색안경으로 사태를 보는 생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견(常見 항상상 볼견)이고, 다른 하나는 단견(斷見 끊을단 볼견)입니다. 글자 그대로 상견이 모든 것에는 '불변하는 것(常)'이 있다는 견해(見)라면, 단견은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변해 '연속성이 없다(斷)'는 견해(見)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견은 아주 강한 절대적인 인과론이고, 단견은 인과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상견도, 단견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있는 그대로 사태를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 원인과 결과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무관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58-159
혜능 스님이 혜명 상좌가 대유령에까지 추적하여 자기 앞에 이른것을 보고 가사와 발우를 돌 위에 놓고 말했다. "이것들은 불법을 물려받았다는 징표이니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대가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도록 하라!" 혜명은 그것을 들려고 했으니 산처럼 움직이지 않지 당황하며 두려워했다. 혜명은 말했다. "제가 온 것은 불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가사 때문은 아닙니다. 제발 행자께서는 제게 불법을 보여 주십시오." 혜능 스님이 말했다. "선(善)도 생각하지 않고 악(惡)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때 어떤 것이 혜명 상좌의 원래 맨얼굴인가?" 혜명은 바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혜명은 깨달았다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혜능에게 절을 올리며 물었다. "방금 하신 비밀스런 말과 뜻 이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혜능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네. 그대가 스스로 자신의 맨얼굴을 비출 수만 있다면, 비밀은 바로 그대에게 있을 것이네." 혜명은 말했다. "제가 비록 홍인 대사의 문하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맨얼굴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마치 사람이 직접 물을 먹으면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스님께서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그러자 혜능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이제 홍인 대사를 함께 스승으로 모시는 사이가 된 셈이니, 스스로를 잘 지키시게." <무문관> 23칙, '불사선악(不思善惡)' 164-165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긍정하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외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것도, 엄청난 부를 욕망하는 것도, 그리고 학위를 취득하려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65
"선과 악을 넘어. 이것은 적어도 좋음과 나쁨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니체의 주저 중 하나인 <도덕의 계보학>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Good & Evil)'과 '좋음과 나쁨(Good & bad)'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핵심은 '선과 악'의 기준과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외적인 권위에 의해 부가되지만, '좋음과 나쁨'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외적인 권위로는 종교적 명령이나 사회적 관습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선악이라는 관념은 우리 자신의 삶에 기원을 두기보다는 외적인 권위에 굴복하고 적응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9
선악을 넘어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맨얼굴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삶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니체는 초인(Ubermensch)이라고, 혜능은 부처라고 불렀던 겁니다. 170
동산(東山)의 법연 스님이 말했다.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 보라! 그는 누구인가?" <무문관> 45칙, '타시아수(他是阿誰)' 172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1908~2009)는 1955년에 출간된 자신의 주저 <슬픈 열대>에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자야말로 계급과 권력이 발생하는 기원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문자가 출현하면서 문자를 독해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사람들이 분화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오래된 위계적 분업 체계가 발생한 것도 사실 문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174
조주가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어싿. "계십니까? 계십니까?" 암자 주인은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조주는 "물이 얕아서 배를 정박시킬 만한 곳이 아니구나"라고 말하고는 바로 그곳을 떠났다. 다시 조주가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계십니끼? 계십니까?" 그곳 암자 주인도 역시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조누는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절을 했다. <무문관> 11칙, '주감암주(州勘庵主)' 189
<서경(書經)>에도 나오지 않던가요. "성인도 망념을 가지면 광인이 되고, 광인도 망념을 이기면 성인이 된다." 195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마조는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무문관> 33칙, '비심비불(非心非佛)' 197
마조의 개성을 이해하려면, 그가 자신의 스승 남악(南岳, 677~744)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남악 스님은 바로 육조 혜능(六祖慧能)의 직제자이지요. 마조와 나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전해옵니다. 어느 날 남악이 마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좌선하여 무엇을 도모하는가?" 그러자 마조가 말했습니다. "부처가 되기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남악은 벽돌 한 개를 가져와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이한 풍경에 마조는 스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벽돌을 갈아서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당황스런 얼굴로 마조는 물었다고 합니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남악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마조의 이야기를 담은 <마조록(馬祖錄)>에 실려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198-199
더 좋다는 것을 추구하고 더 나쁘다는 것을 피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외적 가치의 노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런 일체의 가치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 평생 남의 꽁무니마 ㄴ쫓아다녀서야 어떻게 자신의 의지대로 한걸음이라도 걸어 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란 무엇인가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착은 무엇인가에 집중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200
마조를 상징하는 명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평상시의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종이 자랑하는 불겨엥 대한 지적인 이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종 전통에서 강조하는 좌선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저 평상시의 마음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3
물을 긷고 땔나무를 나를 때도, 제자들에게 몽둥이질을 할 때도, 최고 권력자를 만날 때도, 어느 경우나 '평'의 마음이 '지속'될 때 마침내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204
어느 스님이 말했다. "저는 최근 이 사찰에 들어왔습니다. 스승께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러자 주조는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는가?" 그 스님은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그럼 발우나 씻게." 그 순간 그 스님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무문관> 7칙, '조주세발(趙州洗鉢)' 213
마음을 양파 껍질처럼 벗겨서 제거하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박이라고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즉 불법은 집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에 집착하는 것 자체도 집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내면이냐 외면이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17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순간, 아니면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219
운문 화상이 말했다.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칠조(七條)의 가사를 입는 것인가?' <무문관> 16칙, '종성칠조(種聲七條)' 221
벤야민의 주저 <아케이드 프로젝트(Arcades Project)>에는 "역사의 진보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진보도 항상 그때그때의 1보만이 진보이며 2보도 3보도 n+1보도 결코 진보가 아니다." ...
1보는 걷지 않고서 꿈꾸는 2보도, 3보도, 그리고 n+1보도 단지 백일몽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말해 2보보다는 3보를, 3보다는 4보를, 아니 100보를 꿈꾸는 순간, 우리는 1보 내딛는 것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222
'젊은 사람의 소중한 역할이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과 부딪히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가치도 없어!'라고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며 강압적이라는 걸 스스로 확신하는 데 있다. - 바디우(Alain Badiou, 1937~) 231
위산 화상이 백장 문하에서 공양주의 일을 맡고 있을 때였다. 백장은 대위산의 주인을 선출하려고 위산에게 수좌와 함께 여러 스님들에게 자신의 경지를 말하도록 했다. "빼어난 사람이 대위산의 주인으로 가는 것이다." 백장은 물병을 들어 바닥에 놓고 말했다. "물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 둘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수좌가 먼저 말했다. "나무토막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백장은 이어 위산에게 물었다. 그러자 위산은 물병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나가 버렸다. "수좌는 위산에게 졌구나!"라고 웃으면서 마침내 위산을 대위산의 주인으로 임명했다. <무문관> 40칙, '적도정병(?倒淨甁)' 232
모든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들판에 가득 핀 다양한 꽃들처럼 자기만의 향과 색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화엄세계입니다. 233
불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선종의 역사는 자기가 속한 학파를 극복하는 역사, 혹은 스승의 스타일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단독화(singulariza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에 이른 순간. 233
스승을 통쾌하게 짓밟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나 사상이 범접하기 힘든 불교만의 정신이자 스타일입니다. 234
삶의 주인공은 죽이 되는 밥이 되든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238
흑암 화상이 말했다. "서쪽에서 온 달마는 무슨 이유로 수염이 없는가?" <무문관> 4칙, '호자무수(胡子無鬚)' 240
<이입사행론>은 깨달음에 들어가는(入) 두 가지(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입(理入)'이고, 다른 하나는 '행입(行入)'입니다. 이치로 드어가는 지적인 방법과 실천으로 들어가는 실천적인 방법, 이 두 가지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242
어느 스님이 노파에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면 되나요?"라고 묻자, 노파는 "똑바로 가세요." 스님이 세 발짝이나 다섯 발짝인지 걸어갔을 때, 노파는 말했다.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뒤에 그 스님이 이 일을 조주에게 말하자, 조주는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 그 노파의 경지를 간파하도록 하마"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날 바로 노파가 있는 곳에 가서 조주는 그 스님이 물었던 대로 묻자, 노파도 또한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다. 조누는 돌아와 여러 스님들에게 말했다. "오대산의 노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제 완전히 간파했다." <무문관> 31칙, '조주감파(趙州勘婆)' 266
용기가 있어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이 바로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근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근기여서 부처가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끈덕지게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상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사에는 상근기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산사라는 좋은 조건 때문에 부처가 되려는 열망이 쉽게 식지 않아서 사람들이 끈덕지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268-269
향엄 화상이 말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랐는데,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있지만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지도 않고 발로고 나무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하자. 나무 아래에는 달마가 서쪽에서부터 온 의도를 묻는 사람이 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가 질문한 것을 외면하는 것이고, 만일 대답한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무문관> 5칙, '향엄상수(香嚴上樹)' 282
불교에서는 행동을 업(業, Karman)이라고 합니다. 행동은 그에 걸맞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불교의 업보(業報, karma-vipaka)이론입니다. 타인에게 좋든 그르든 강한 결과를 남기는 업을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삼업(三業)이지요.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身業), 말로 짓는 업을 구업(口業),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업(意業)이라고 부릅니다. 283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해야만 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에도 침묵해야만 합니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침묵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286
어느 날 덕산 화상이 발우를 들고 방장실을 내려갔다. 이때 설봉 스니이 "노스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도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 어디로 가시나요?"라고 묻자, 덕산 화상은 바로 방상실로 되돌아갔다.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암두 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덕산 스님이 아직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덕산 화상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자(侍者)를 시켜 암두 스님을 불러 오라고 했다. 덕산 화상은 암두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 주자, 덕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덕산 화상이 법좌(法座)에 올랐는데, 정말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암두 스님은 승당 앞에 이르러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이제 노스님이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일이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무문관> 13칙, '덕산탁발(德山托鉢)' 298
누구나 알고 있듯 불교는 자비를 슬로건으로 합니다. 보통 자비는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연민이나 동정의 뜻으로 쓰이지만, 산스크리트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우정을 뜻하는 '마이트리(maitri)'라는 말과 연민을 뜻하는 '카루나(karuna)'로 구성된 합성어가 바로 자비(maitri-karuna)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이트리, 즉 우정 혹은 동료애라는 의미 아닐까요. 자비라는 말에는 근본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라는 수직성보다는 동등한 두 사람이라는 수평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우리와 동등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299
오조 법연 화상이 말했다. "길에서 도(道)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 말해 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응하겠는가?" <무문관> 36칙, '노봉달도(路逢達道)' 323
'왜 부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삶을 당당히 영위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판, 즉 타인의 말이나 침묵에 동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7
조산 화상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저 청세는 고독하고 가난합니다. 스님께서는 제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산 화상은 말했다. "세사리!" 그러자 청세 스님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조산 화상은 말했다. "청원의 백 씨 집에서 만든 술을 세 잔이나 이미 마셨으면서도, 아직 입술도 적시지 않았다고 말할 셈인가!" <무문관> 10칙, '청세고빈(淸稅孤貧)' 334
생면부지의 남이나 혹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행위, 즉 보시는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시라는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의지를 수반하는 수행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보시이기 때문이지요. 337
점심 공양 전에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와 앉자 청량(淸?)의 대법안 화상은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때 두 스님이 함께 갓 발을 걷어 올렸다. 그러자 대법안 화상은 말했다. "한 사람은 옳지만, 다른 한 사람은 틀렸다." <무문관> 26칙, '이승권렴(二僧卷簾)' 343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상태에 있지 않고, 최소한 세 가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객(主客) 관계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번데기는 맛있는 대상이고 자신은 번데기를 좋아하는 주체라고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반대로 번데기는 혐오스러운 대상이고 자신은 번데기를 싫어하는 주체라고 믿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들의 특징은 모두 자신의 과거 습관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아는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번데기가 먹음직스럽거나 혐오스러운 것은 모두 자신의 과거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할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현실에서 여전히 번데기를 좋아하거나 혐오하리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과거 습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번데기를 기호 식품으로도 혐오 식품으로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깨달은 사람, 즉 부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44-345
남전 화상이 말했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앎은 도가 아니다." <무문관> 34칙, '지불시도(智不是道)' 351
참선과 같은 치열한 내성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불성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스스로 불성을 실현하며 사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54
임제의 말처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야" 부처입니다. 홀로 있을때는 주인으로 살 수 있지만 타인과 만났을 때 바로 그 타인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혼자 있을 때도 주인이고, 열 명과 함께 있을 때도 주인이고, 만 명과 함께 있을 때도 주인일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58
자신이 부처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것과 실제로 부처가 되었다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는 법입니다. 358
석상 화상이 말했다. "100척이나 된느 대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또 옛날 큰스님은 말햇다. "100척이나 된느 대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비록 어떤 경지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직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서 반드시 한 걸음 나아가야, 시방세계가 자신의 전체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게 될 것이다." <무문관> 46칙, '간두진보(竿頭進步)' 360
실연을 당한 사람만이 실연한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고,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된 사람만이 음악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361
키에르케고르(Soren Kierkegaard, 1813~1855)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이지만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객관적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확히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주저 중 한 권인 <사랑의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 '주관적'이라는 말은 'subjective'를 번역한 겁니다. 잘 알다시피 철학에서 ' subject'는 주관이자 주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라는 말은 자신을 하나의 주체로, 그리고 주인으로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객과적'이라는 뜻을 가진 'objective'는 사물이나 대상을 뜻하는 'object'라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라는 말은 타인을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는 셈이지요. 364-365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을 주체로 생각하지만, 타인들은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니까요. 당연히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체이고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겁니다. "정확히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민하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타인을 주관으로, 즉 당당한 주체로 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이것이 사랑을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365-366
외도(外道)가 세존에게 물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으렵니다." 세존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감탄하며 말했다. "세존께서는 커다란 자비를 내려 주셔서, 미혹의 구름에서 저를 꺼내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예의를 표하고 떠나갔다.
아난이 곧 세존에게 물어보았다. "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감탄하고 떠난 것입니까?" 그리저 세존은 말했다.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과 같은 사람이다." <무문관> 32칙, '외도문불(外道問佛))' 376
지적인 허영에 빠진 학생에게는 그 허영을 충족시켜 줄 지적인 대답을 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생과 지적인 대화를 한다는 허영심만 가중시킬 테니까요.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답을 해도 그 학생은 제 이야기를 그냥 지적으로 납득할 뿐, 자신의 삶으로 흡수하지 않을 겁니다. 378
삶의 차원에서 매순간 중요한 문제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만일 두 가지의 문제가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의 차원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 내지 못하고, 그저 관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379
무문 스님은 서른두 번째 관무을 마무리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이나 사다리를 밟지 않아야 하고, 매달려 있는 절벽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존해 절벽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단이나 사다리가 우리의 당당한 삶을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그것에 좌지우지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도움이 되어도 그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 계단과 사다리로 상징되는 일체의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온몸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그건 깨달음일 수도 없는 법이니까요. 깨달음은 스스로 주인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82
어떤 스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법(法)이 있으신가요?"라고 묻자, 남전 화상은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법인가요?" 남전 화상은 말했다. "마음(心)도 아니고, 부처(佛)도 아니고, 중생(物)도 아니다." <무문관> 27칙, '불시심불(不是心佛)' 400
디테일에 빠지지 말고, 그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401
오조 법연 화상이 말했다. "비유하자면 물소가 창살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머리, 뿔, 그리고 네 발굽이 모두 창살을 통과했는데, 무엇 때문에 꼬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인가?" <무문관> 38칙, '우과창령(牛過窓櫺)' 409
창이 있는 방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자유를 잃고 갇혀 있는 물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남달랐습니다. 구속에 적응하기보다는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자유를 되찾으려는 열망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서 인지, 그 물소는 창살을 지나 바깥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유의 대로가 펼쳐진 겁니다. 이제 그냥 아무 곳이나 뛰어가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몸통이 창살을 통과했다면, 꼬리는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 무엇일까요. 창살을 통과하지 않은 그 물소의 꼬리는? 자유를 되찾은 그 물소는 혼자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탈출한 방에는 아직도 동료 물소들이 갇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물소들이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탈출구를 동료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꼬리를 창살에 남겨둘 수밖에요. 이것이 자비의 마음, 다시 말해 이타의 마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416
도솔 종열 화상은 세 가지 관문을 설치해, 배우려는 사람에게 물었다. "깨달은 사람을 찾아 수행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불서을 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의 불성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불성을 알았다면 삶과 죽음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그대는 삶과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겠는가? 삶과 죽음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면 바로 가는 곳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육신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흩어질 때, 그대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무문관> 47칙, '도솔감관(兜率三關)' 418
<무문관>의 48개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선사들은 가혹하게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꺼 버리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불을 켜기를 촉구합니다. 420
새끼들을 절벽에 던지는 호랑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천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로 제자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니까요. 421